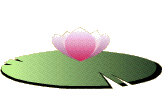http://media.daum.net/series/newsview?seriesId=113237&newsId=20161015030315649
[Why] 여행이란, 언제나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
[그 작품 그 도시] '모든 요일의 기록' ― 파리, 일산, 가로수길
조선일보 백영옥·소설가 입력 2016.10.15. 03:03 수정 2016.10.15. 03:28
캠핑과 아웃도어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트레킹 관련 연재 제안을 받고 거절했었다. 나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등산 하면 떠오르는 '정상'이라든가 '극복'이란 말에 얼마간 거부감도 있었다. 내게는 고어텍스로 된 등산복도 없고, 캠핑 도구라고는 어릴 때 쓰던 낡은 버너와 찌그러진 코펠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트레킹 관련 글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쓰기로 했다. 제목은 도시 트레킹. 일상을 벗어난 여행이 아니라 일상 탐험 같은 매우 미시적 글이었다. 동네 여행 전문가로 내가 매일 체험하는 대표적 장소는 호수공원이었으므로 나는 그곳에 관한 글도 썼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호수공원 나무 산책'이라는 공원 안 나무 150종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있었다. 정말 놀랍고 반가웠다.

나는 여행과 일상의 구분이 싫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곳'이 그리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매일 일상이 있다. 하지만 여행이란 예외적 축제가 놓이면 어쩐지 오늘은 내일을 위해 견디는 것쯤으로 조율 또는 재정의되어 끝도 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든다. 오늘이 오늘로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일상은 바람이 살랑 부는 노천 카페에서의 커피가 아닌 한낮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회사 앞 식당의 점심 속에 있다. 그 일상은 스탠드 불 하나 켜놓고 밤새워 쓰는 글이 아니라 창백한 형광등 빛 아래서 작성하는 문서 안에 있고, 잘 포장된 초콜릿이 아니라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는 껌 속에 있다. 보고 싶은 책보다는 봐야 하는 서류 더미에 더 많이 할애된 일상,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한 소통보다는 의무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많이 소모되는 일상, 갓 갈아낸 자몽 주스보다는 믹스 커피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어쨌거나 일상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카피라이터 김민철의 에세이 '모든 요일의 기록'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일상'이란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몇 년 전 이름이 남자 같은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가로수길에 있는 광고 회사 TBWA에서였다. 그녀의 보스를 취재했던 탓에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옆에 서 있던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지쳐 보였다.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미팅을 나서려는 모양이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잔상 때문인지 '모든 요일의 기록'은 그 단단한 고단함이 문장 안에 스며 있는 것처럼 읽혔다.
나도 한때 카피라이터였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조차 하기 싫지만. 밀란 쿤데라는 소설에서 카피를 '현대시'라고 정의했다. 그 문장이 실린 소설이 '정체성'인지 '불멸'인지 '이별의 왈츠'였는지 늘 헷갈린다. 너무 많이 읽은 탓일까. 너무 얕게 읽은 탓일까. 다만 책을 읽던 날 나는 노트에 광고 카피란 '욕망을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란 말을 적어 놓았다.
당시 소설가 꿈이 좌절된 직장인 '나'는 카피라이터를 실패한 시인으로 규정했고, 밑도 끝도 없이 몽상적 글을 흘려 놓았다. 정작 광고에는 한 줌도 쓰지도 못할 글들이었다.
직장에 오래 다니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고 믿고 자란 세대였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며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나 자신을 점점 더 낯설고 모호한 타인으로 만든다. 모든 것이 경계 없이 뒤섞이는 것이다. 내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날은 우리 모두에게 결국은 찾아온다. 지치는데도 지쳤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날. 더 이상 관성으로도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나 자신과 마주치는 날 말이다.
그녀는 파리로 떠나기로 한다. 성실히 자료를 모은다. 그러나 파리에 관한 기록을 뒤지던 그녀가 결국 만나게 되는 건 그녀에게 '일상'이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만약 당신이 젊은 시절 파리에 살 수 있는 행운을 누린다면 당신이 평생 어디를 가든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 나는 카뮈의 '안과 겉' '이방인' '시지프 신화'까지 달음박질쳤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침이 찾아왔다. … 하지만 김화영이 딱 잘라 말했다. 참으로 이곳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 곳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사람, 가득하게, 에누리 없이 지새우며 행복한 사람의 땅'이라고 지중해에 대해 딱 잘라 말했다."
이 말 뜻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미래에도 행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여행을 떠난 그때도 진정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여행은 우리를 예외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여행이 일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 미래 여행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여행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행을 언제나 이렇게 정의하길 좋아했다. 내게 여행이란 언제나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파리라는 예외가 아름다운 건 내게 서울이라는 일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행 잡지를 만든다면 동네에 관한 작은 잡지를 만들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의 반경 몇 킬로미터,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곳 이야기를 담고 싶다. 잡지에는 새롭게 생긴 카페나 음식점에 관련된 것도 실리겠지만,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동네와 사람들의 변화이다.

가끔 '우리 동네에서 50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써도 재밌을 것 같다. 어느 카페의 타임 세일 샌드위치의 맛과 동네 공원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 볼 만한 공연에 대한 기사를 실어도 좋겠다. 석 달째 공사 중인 정체불명 가게가 어떤 곳인지를 파헤치는 미스터리 기사는 어떤가. 보컬 학원이 유독 많은 우리 동네엔 버스킹을 하는 팀이 하루에도 몇씩 출몰하는데, 그것에 대한 글만 써도 한 페이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봐도 재밌는 잡지를 만들겠다는 야심 따위는 없다. 어차피 동네 사람들이 보는 잡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동네를 걷고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행자의 시선으로 동네를 바라보면 생기는 일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호수공원의 냄새가 구려지기 시작했다. 은행나무가 노란 단풍을 제조하는 냄새다. 내가 변태인 걸까. 코를 틀어막아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가을 냄새다.
● 모든 요일의 기록―김민철의 에세이
'●불교&자료&관심사● > 뉴스.시사.요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결혼의 민낯]⑤20대의 비혼주의 "낭만, 자유 사라진 결혼" (0) | 2017.02.18 |
|---|---|
|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캘리그래피 세계 (0) | 2016.11.22 |
| 2016 노벨 문학상, 밥 딜런..그의 노랫말엔 엘리엇과 키츠가 있다 (0) | 2016.10.14 |
| 어른이 되고 싶어? (0) | 2016.09.24 |
| 부부의 사랑은,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 (0) | 201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