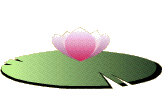의사이면서 기독교 신학자인 저자의 생각은 정반대다. 자기 삶에 충실한 건 권리가 아닌 의무다. 우리는 장미를 가꾸고 보살필 수 있지만, 장미꽃 한 송이를 창조할 순 없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기에 스스로를 죽일 권리 또한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저자는 인간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영혼이 성장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신으로 향하는 길을 단절시킨다는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라몬과 같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희망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의사는 충분한 통증 치료를 통해 말기 환자가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의료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보살펴야 한다.
무조건적인 연명 치료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는 고통만 연장시킬 뿐이다. 이 경우 생명 유지 장치의 ‘플러그를 뽑는’ 게 환자를 위한 길이다. 저자는 다양한 임상 사례를 들어 논지를 뒷받침한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약물 투여량을 줄여 환자의 영원한 휴식을 돕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두 달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잘 죽는 것(well-dying)’은 21세기 새로운 화두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차례다. 인간에겐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스무 세기 전 세네카가 했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친구여, 우리는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네.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일은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죽는 방법도 배워야만 한다는 거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