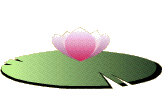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육체’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라는 용어는 있어도 ‘바디메이트’라는 용어는 없다. ‘섹스파트너’ 정도로 취급되긴 하지만.
하지만 어찌 남녀관계가, 적어도 그 관계가 동물적 육체와 감성 그리고 욕망을 지닌 관계라면
단지 ‘소울’이라는 단어로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영화는 비록 비극적 상황을 빌려 감정선을 멜랑꼴리하게 건드리고는 있지만
남녀의 관계가 ‘몸’에 충실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여자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처음으로 햇볓을 받는 장면이다.
자연의 햇볓을 이렇게 받는 다는 것에서 부터 이 영화는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무척 ‘본증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두 다리가 사라진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전통적인 멜로 영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고지순’한 남자의 헌신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이 영화는 매우 직설적으로 다가간다.
“욕구는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알게된 남자 주인공과 잠깐잠깐의 만남을 이어가다 두 남녀는 ‘섹스’를 하게 된다. 여자는 물론 처음에는 긴장을 하지만 둘 사이의 섹스장면은 CG처리되 너무도 완벽하게 보이는 그녀의 잘려진 다리를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게 할 만큼 매우 사실적이고 밀도 있게 그려진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섹스 이후 삶의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영화의 전반부인데 이 부분 만으로도 영화는 충분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육체적으로 상처입은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헌신의 시선이 아닌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관계.
그리고 그 욕망과 본능이라는 것이 그저 이성의 육체를 탐하는 것이 아닌 ‘관계’ 자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육체적으로 상처 입은’ 여자와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남성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이야기 할 때 ‘배려’, ‘이해’, ‘존중’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묻고 싶다.
당신은 이 사진처럼 당신의 동반자와 끈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육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지?
스킨쉽은 아이를 기르는 모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이 된 연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다.
참고 글 자료 3
러스트 앤 본 - 한동안 멈추지 않을 울림 (오락성 7 작품성 8)

이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자연광이다. 밑바닥의 삶이지만 남녀는 어두운 지하 창고나 방구석이 아닌 오픈된 공간으로 나간다. 얻어터지고 피를 흘려도, 뭉뚝한 두 다리가 남루하게 느껴져도 언제나 햇빛은 인물을 비추고, 그때 비로소 남녀는 솔직한 감정을 얼굴에 드러낸다. 차 안에서도, 테라스에서도 자연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물의 감정을 포착해내는 또 하나의 카메라처럼 보인다.
마리옹 꼬띠아르와 마티아스 쇼에나에츠 두 배우는 그 매혹적인 찰나의 순간들을 표정은 물론 온몸으로 표현한다. 마티아스 쇼에나에츠가 본능적 야수성을 영화 전반에 걸쳐 압도적으로 분출한다면, 마리옹 꼬띠아르는 심리 변화의 섬세한 결을 놓치지 않는다. 병실에서 상실감을 표현할 때도, 사고 후 처음으로 물속에 뛰어들 때도, 기구에 매달려 석고로 본을 뜰 때도, 처음 의족을 달고 걸어서 외출할 때도, 조심스럽게 의족의 스타킹을 벗을 때도 그녀의 세밀한 디테일은 숨 막히게 처절하고 격정적이고 아름답다.
먹먹하다. 옥죄던 긴장이 벅참으로 변해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추스르기 무섭게 몇 번이고 여진이 훑고 지나간다. 삶의 나락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남자와 여자의 신파 멜로드라마가 무어 그리 대단할 게 있다고. 하지만 자크 오디아르의 < 러스트 앤 본 > 은 그 통속 스토리와 장르 컨벤션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특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마리옹 꼬띠아르의 창백한 얼굴도, 스크린에 눈부시게 투영된 자연광도, 마티아스 쇼에나에츠가 터뜨리는 울음도, 두 사람이이 되찾은 삶의 빛도 가슴 속에서 한동안 울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_서정환 기자(무비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