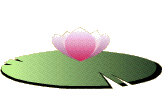엄마 돌아가시기 전 '버킷리스트', 눈물 나네
[부모님의 뒷모습⑩] 스티커 모으는 우리 엄마오마이뉴스강정민입력2015.09.08 0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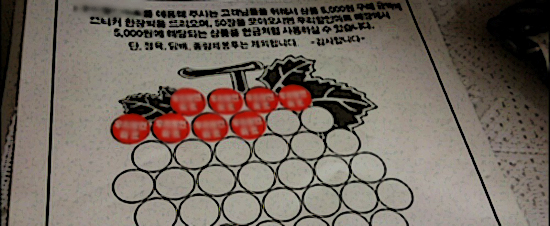 |
| ▲ 슈퍼마켓에서 주는 스티커, 엄마는 여기에 집착했다. |
ⓒ 오마이뉴스
|
엄마가 묻는다. 마침 난 친정에 과일이 없어서 슈퍼에서 포도를 사 오는 길이었다. 어쩐지 엄마의 웃는 표정이 이상하다 했더니 스티커 때문이었구나.
"안 줬어. 영수증 있으니까 나중에 달라고 해."
"나중에 가면 줬다 할지 몰라. 지금 가서 받아 와."
이해가 안 된다. 스티커 몇 장 받아오라고 이 더위에 슈퍼에 다시 다녀오라는 엄마가. 슈퍼가 가깝기나 하나? 300m는 될 거리다. 예전에 엄마는 이런 것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엄마는 문방구를 10년도 넘게 운영해서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겹게 돈을 버는지 잘 알고 있다. 마지못해 답했다.
"알았어. 갔다 올게."
옆에 있던 언니가 나를 말린다.
"가지마. 엄마, 내가 돈으로 줄게. 스티커 받으러 정민이가 거기까지 가야 해? 할머니들은 꼭 그러더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흙 파서 장사해? 그거 팔아 얼마 남는다고? 엄마까지 좀 그러지 마."
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스티커 종이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엔 변화가 없다.
"이거 다 채우면 선물 받는단 말이야."
스티커 몇 장에 '방긋' 웃는 엄마
아이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싸움 나겠다. 내가 빨리 슈퍼에 가는 수밖에 없다.
"언니는, 참…. 엄마가 재미로 하는 거지. 빨리 갔다 올게."
후다닥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다. 이깟 스티커 쪼가리를 받겠다고 마흔 넘은 나이에 슈퍼 찾아가는 게 영 민망하다. 가게에 가니 사장님은 계산하느라 바쁘다. 어렵사리 차례가 와서 말을 꺼냈다.
"저, 아까 포도 사 갔는데 스티커를 안 주셔서…."
사장은 내가 내민 영수증을 살펴본다.
"카드로 계산하셨네요? 그러면 스티커 없어요."
아, 창피하다. 인사만 겨우 하고 나왔다. 집에 가선 또 뭐라고 하나? 스티커 못 받았다고 하면 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다. 그럼 또 시끄러워질 테고. 그냥 스티커를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낫겠다.
집에 와서 부엌 서랍에 영수증을 얼른 넣었다. "엄마 스티커 넣어 놨어." 엄마가 좋아한다. 스티커 몇 장에 저리 좋으실까? 언니가 집에 가고 나서 엄마한테 사실을 말씀드렸다.
엄마가 이렇게 스티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얼마나 적적하시면 이런 일에 다 집착할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건강체험관에 열심히 다닐 때도 그랬다. 매일 아침이면 체험관에 가셨다. 내가 오전에 친정에 들른다고 전화를 하면 오후에 오라고 하셨다. 매일 가면 비누니 휴지니 하는 소소한 선물을 받는 것 같았다. 물론 엄마가 사들인 건강체험관의 값비싼 물건에 비한다면 받은 선물은 껌값에 불과하다.
여가 활동의 선택지가 줄어든다
 |
| ▲ 나를 키워낸 엄마의 손 |
ⓒ 강정민
|
"엄마, 저 아래 노인정에 다니면 어때요? 우리 아파트 노인정도 월 회비 만 원만 내면 점심까지 다 준다고 하던데."
"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도 다 기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 나 같은 사람 처음 들어가면 적응하기도 힘들어."
이번엔 친정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신청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다.
"엄마, 거기 노인복지관에서 노래 부르는 거 배우는 건 어때? 내가 신청해 줄까?"
"나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
솔직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버스 타고 다니자니 한참 걸어야 하고 그렇다고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다. 지나가는 어르신을 보면 나이를 가늠했다. 뭐하면서 지내실지 상상을 해봤다. 다정히 부부가 산책을 나온 모습을 보면서 노년기에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크게 의지가 되는지 새삼 느낀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집안 어른들의 나이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다.
"할아버님이 아흔다섯까지 사셨으면 돌아가시기 전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권할 만한 노후 생활이 딱히 없다. 나도 나이 팔순이 넘으면 뭘하면서 지낼까. 남편은 가끔 은퇴하면 도시락 싸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나이 팔순엔 책을 보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찾아도 엄마에게 내가 딱히 권해 드릴 뭔가가 없다.
예전의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는 외출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청력도 잃어 가신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나 역시 우울해진다. 나이 마흔이 넘은 난 세 아이가 있고 남편도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는 이제는 내게 밥을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던 예전의 그런 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존재만으로도 엄마는 내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언니는 한때 날 '마마걸'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내게 엄마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면 마음의 안식처다.
내가 첫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에 시달릴 때 엄마 퇴근 시간만 기다려 매일 전화를 걸었다. 그 통화로 난 우울한 시기를 버텨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외로운 엄마에게 전화한다. 매일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지만 엄마는 "전화해 줘서 고맙다"라면서 전화를 끊는다.
| ○ 편집ㅣ김지현 기자 |
'●불교&자료&관심사● > 멋진 삶을 위한 웰다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질랜드 여성, 암으로 죽음 앞두고 버킷 리스트 여행 (0) | 2016.04.10 |
|---|---|
| 가족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품위있는 죽음' (0) | 2015.12.10 |
| "멋진 삶이었습니다" 품위있게 죽음 끌어안은 거목들 (0) | 2015.08.29 |
| 건강한 영국 할머니, 왜 스스로 죽음 택했나 (0) | 2015.08.12 |
| 건강한 英70대,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0) | 2015.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