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따라 살려하네
암자가 위치한 곳이 산 꼭데기라 들어오는 길이 보통 가파른 것이 아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택시를 타고 오는데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방이 까마득하기만 했다. 정상에 올라오자 구름인지 안개인지 희뿌옇게 싸인 장막의 저 너머로 사찰의 지붕이 보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타고온 택시가 떠나기 무섭게 주변은 금새 어둠으로 덮혀왔다. 벌써 밤이 되어가는 것이다. 어디가 어딘지,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없고 인사 나누고자 하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안개 저 너머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기에 불나방 신세가 되어 빛을 따라 가서 문을 열었다. 아! 그렇구나. 그곳은 공양간이었고, 마침 대중들의 저녁 만찬이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은 구름과 안개뿐이러니, 구름위 천상(天上)의 만찬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하지만 그 황홀한 자아도취도 금새 허망한 바람으로 사라져 버리고야 만다. 신비로운 선계(仙界)의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한 저녁 만찬의 흥에 겨워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여남 명이나 될듯한 그들은 모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었다. 밥 먹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 중증은 아닌듯 했지만, 솔직히 암자 생활에 대해 가졌던 공허한 장밋빛 이상에 비한다면 첫인상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나마 나는 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기에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은 그리 없는 편이다. 그런데도 산간 오지 꼭대기 암자에서까지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필연적인 숙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내가 가는 곳엔 늘 그들이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에 비교적 잘 훈련되어 있는 나까지 섬뜻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스님들이 더 이상한 것은, 내가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을 아시면서도 거의 무관심이다. 여자스님 두 분은 창가의 구름위에 둥둥 앉아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평화스럽게 하던 만찬을 계속하실 뿐이었다. 나는 어떻하라구....... 그제서야 장애의 정도가 조금 덜해 보이는 한 키 큰 청년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아마도 그들중에서 대표자인듯 했다. 아까 전화했던 분이냐고 묻는 그의 말투도 아주 어눌했다. 그렇다고 하자 "공양을 하셔야죠?" 한다. 물론 그렇지. 밥은 먹어야지....... 나는 그제서야 그렇게 그들 옆에 앉아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선계(仙界)의 황홀한 만찬에 동참하게 된다. 묵 무침에 다시마 튀각 그리고 나물을 넣은 짠 된장국 그것이 전부다. 할 말도 없고, 별로 말 할 필요도 없는 묵뚝뚝한 식사가 시작되고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그 청년이 내게 묻는다. "둘러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지내러 오셨어요?" 나는 청년의 그 조심스런 한마디 말 속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그의 인생이 지녀온 너무도 무겁고 고통스런 슬픔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그들과 함께 섞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살면 매일 우리랑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해야하는데,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하는 그런 물음이란 것을 내가 모를 리가 없다. 나는 태연자약하고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지낼려구요............." 중증 지체를 가진듯한 여자애들은 밥을 먹다말고 킥킥 밥풀을 흘리면서까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웃고 난리다. 그들이 웃을 때, 따라 웃어줘야 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성한 사람들의 의무이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한 식구가 되었고, 그제서야 스님도 내게 관심을 보이셨다. 식사가 끝이 나고 키 큰 청년은 내가 묵을 방을 골라주고 이불도 가져다 주며 그야말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깍듯하고 말쑥한 벨보이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친밀감이다. 새까만 밤이 되고 안개는 더욱 자욱한데 스님이 종무소로 나를 불러 차를 내놓으신다. 나도 여자였으면 스님이 되었을까? 차를 조용히 거르는 스님의 하얀 손에는 나와 또래인 여인의 향이 그대로 베어있어 포근하다. 그 손길을 스치며 숱하게 지나갔을, 스님이 된 한 여인의 다난한 번민과 고뇌가 따사로운 찻잔의 피어오르는 뽀얀 기체로 승화되 오른다.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또 한 분 여스님은 아까는 몰랐더니 아주 앳된 표정이 아마도 학승(學僧)이신가 보다. 천상(天上)의 만창장에서 처음 본 무관심한 스님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생(生)의 상흔(傷痕)인양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의 무리에 쫓겨, 나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오는 어둔 숲으로, 법당 처마에 매달린 피안의 풍경이 요란하게 흩어진다. 처음 공양간에서 스님의 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아라......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라..... 그것이었다. 스님은 내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여기서 장애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해야된다는 사실을 전혀 귓뜸해 주시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인연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만일 스님이 장애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 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가끔씩 자원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과 그들과 피부를 맞대고 함께 산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있으려면 있고, 떠나려면 떠나라...... 처음에 보이신 스님의 무관심한 태도는, 모든 것을 나의 인연에 맡기고자 했던 참으로 적절하고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셨던가!! 만남과 떠남과 머무름이라는 인연에는 인력(人力)이라는 꾸밈과 장식이 가미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무위(無爲)라 함은 인간의 의식적인 작용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자연법칙에 맡기는 순수한 인연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얼마를 더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만이라도 나는 무위(無爲)한 자연의 한조각 바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눞고 싶으면 눞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혼잡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자연의 한 구성물이 되어보고 싶은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무위(無爲)이며 도통(道通)으로 이르는 길이 아닐까? 오늘은 스님이 주신 털모자가 아무래도 유용하게 쓰일 모양이다. 단촐한 털모자 하나만 쓴채로 생(生)의 언저리 길을 따라 향기로운 숲 속의 겨울비를 흠뻑 맞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
'●불교&자료&관심사● > 불교이야기·불교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신도를 고객처럼…감동을 주라 (0) | 2006.12.09 |
|---|---|
| '25242 결식아동돕기'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 | 2006.12.03 |
| [스크랩] 이모씨 변호사에 대한 불교청년회의 답변 (0) | 2006.11.20 |
| [스크랩] 이모씨의 방문 즐거운 것인가? (0) | 2006.11.20 |
| [스크랩] [이명밖]개신교표만 합쳐도 대선승리 치밀계산? (0) | 2006.11.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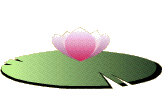
 오늘은 날이 제법 추워도 창문을 반쯤은 열어두어야 할 것 같다. 흠뻑 젖어드는 숲속으로 내리는 겨울비 소리의 단 한 낱줄도 놓치기 싫은 마련이다. 정처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연애(戀愛)하여 창은 열어두었으나,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구름과 안개 뿐이다.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매일 아침 찾아와 울어주던 산새들의 소리도 오늘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비를 피해 아늑한 둥지 속에서 그네들만의 소중한 휴일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 작고 외로운 산지 암자를 찾아 들어온지도 한 열흘이 지났나보다.
한 달 정도 머물려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다니, 도시에서나 산속에서나 세월은 공히 빠른 것이다!
오늘은 날이 제법 추워도 창문을 반쯤은 열어두어야 할 것 같다. 흠뻑 젖어드는 숲속으로 내리는 겨울비 소리의 단 한 낱줄도 놓치기 싫은 마련이다. 정처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연애(戀愛)하여 창은 열어두었으나,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구름과 안개 뿐이다.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매일 아침 찾아와 울어주던 산새들의 소리도 오늘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비를 피해 아늑한 둥지 속에서 그네들만의 소중한 휴일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 작고 외로운 산지 암자를 찾아 들어온지도 한 열흘이 지났나보다.
한 달 정도 머물려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다니, 도시에서나 산속에서나 세월은 공히 빠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