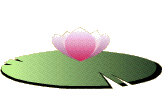경향신문 강화도 | 글·사진 정유미 기자 입력 2017.09.13 20:47
[경향신문] ㆍ‘천년 고찰’ 강화도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가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 누구는 거창하게 ‘하룻밤 출가’라고 표현한다. 하룻밤에 뭘 깨닫기야 하겠는가. 그래도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어서인지 꽤 인기다. 전국 120여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 전등사에서 하룻밤 출가
강화도 정족산성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전등사는 고구려(소수림왕 11년) 때 세워진 삼국시대의 사찰이다. 고려시대 때는 몽골군의 침입으로 재화를 입고, 조선시대 병인양요(1866년) 때는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격전을 치른 역사의 현장이다. 대웅보전 등 보물 6점을 간직하고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마음 비우러 가는데,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이 더 낫겠다 싶었다.
서울 신촌에서 버스 2000번을 탔다. 정족산성 동문까지 1시간30여분. 전등사까지는 걸어서 10분. 숲 사이로 트인 길은 평일인데도 북적였다. 한 해 50만명이 찾고 한 달에 200명 이상이 하룻밤을 머문단다. 전등사에는 일주문과 사천왕상이 없었다. 가파른 돌계단에 올라 영조가 만들었다는 대조루로 들어섰다.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인 채 부처의 집으로 들어섰다.

대웅보전(보물 제178호)은 조선 중기 광해군(1621년) 때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얹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닫집 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85호)이 은은하게 미소를 건넸다. 묘법연화경 목판(보물 제1908호)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보물 제1786호)은 천년의 세월에 빛이 바랬지만 또렷해보였다. 밖으로 나와 약사전(보물 제179호)과 중국 북송 때 들어온 범종(보물 제393호)을 찬찬히 살폈다. 사찰은 단정했다.
오후 6시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400년 된 은행나무와 소원을 비는 나무 옆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님 2명이 번갈아 가며 한참 동안 법고를 두드리는데 무게감 있는 북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진 목어(木漁)와 운판 소리는 청아했고 33번 타종하는 범종은 울림이 컸다.
해질 무렵 전등사 서문과 가까운 성곽으로 향했다. 태정 스님을 따라 10분쯤 가파른 흙길을 올랐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는 땀이 흥건했다. 혹시 일몰을 놓칠까 서두른 것이 다행이었다. 짙은 숲에 가려 있던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 시야가 트였다. 모나지 않은 둥근 해가 너른 진초록 논밭을 선홍빛으로 물들였다. 아파트 10층만 한 높이의 참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았다.

전등사는 해가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한다. 오후 7시30분, 사찰은 고요해졌다. 깨알 같던 별들이 점점 커지더니 고요를 뚫고 하늘에서 쏟아졌다. 저녁 공양을 넉넉히 해두길 잘했다 싶었다. 공양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고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불교의 전통적인 식사법. 버섯과 콩나물 반찬에 흰쌀밥이 나왔다. 방사(坊舍)로 들어와 책 <법구경>을 천천히 읽었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
새벽 4시 둔탁한 목탁 소리가 방사의 문을 흔들었다. 몸을 뒤척이다가, 책을 뒤적이다가 결국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래된 사찰을 감싼 새벽 공기는 서늘했다. 오전 5시40분 사위가 밝아지더니 대웅보전에도 불이 켜졌다. 280년 된 큰 느티나무 둘레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해돋이를 기다렸다. 저 멀리 어두컴컴한 것이 산인 줄 알았는데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이었다. 오전 6시10분 옛날 장독대에 햇살이 길게 내렸다.
불자가 아니면 새벽 예불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조용히 지켜봤다. 범종이 28번 울렸고, 목탁 소리가 15분가량 이어졌다. 일곱 번 큰절을 했고 ‘반야심경’으로 예불은 끝났다.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요. 오늘은 일본인 가족이 5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 김태영 팀장의 얘기를 듣고 대웅전 앞에 서 있던 일본인에게 다가갔다. “한국 사찰은 고요해서 참 좋아요.” 부드러운 미소로 합장하는 일본인에게 이름을 묻자 유미(37), 딸은 유이(4)라고 했다. 기자인 나와 이름이 같고 캐나다에서 만난 절친한 일본인의 딸이 유이인 것도 같았다. 서로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주지 승석 스님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집착을 버리세요. 1년을 반성하면 1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초를 기다리면 다른 생각이 옵니다. 무엇이 그리 고통스럽고 급하십니까.”
전등사를 떠나기 전 단주를 꿰었다. 108개 염주보다는 짧았지만 모난 마음이 둥글어지기를 한 알, 한 알 구슬에 담으며 기도했다.
하룻밤 짧은 출가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잠시였지만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뒤로하고 세속으로 나섰다.

<강화도 | 글·사진 정유미 기자>
'●불교&자료&관심사● > 불교이야기·불교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토회 법륜스님 (0) | 2019.12.24 |
|---|---|
| “성경이든 불경이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같다”/성경을 영화로 만든 대해 스님 (0) | 2017.10.24 |
| "불교 쉽게 전달하려 만화 배워..단순한 표현이 더 어렵더군요" (0) | 2017.04.25 |
| 삶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법정스님 (0) | 2016.11.03 |
| 어머니 금강스님과 함께 인도 여행 다녀온 원성스님 (0) | 2016.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