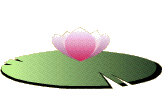수목장(樹木葬)
2004-09-10 조선일보
옛날 선승(禪僧)들은 율무 풀에서 나는 단단한 낟알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한다.
아무 산길에서라도 쓰러져 죽으면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목에 걸었던 염주에선 싹이 터 율무가 됐다.
그래서 스님들은 산길에 율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보면
꼭 걸음을 멈추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읊고 지나가곤 했다.
▶고려대 교수를 지낸 원로 임학자 김장수(金樟洙·85) 박사의
장례가 엊그제 수목장(樹木葬)으로 치러졌다.
고인의 평소 유언대로 화장을 한 후 유골은 경기도
양평의 고려대 농업연습림의 한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무에는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표찰을 붙였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장례법이다.
그 나무는 김 박사의 영혼을 이어가는 영생목(永生木)이 된 것이다.
▶영국의 마을 묘지에선 유골을 묻고 나서 그 자리에 장미를 심는다.
그 장미 가지에 고인의 신원을 새긴 작은 명패를 매어두면 그게 곧 묘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수목장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뼈를 담은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위에 꽃나무를 심는 것이다.
수목장을 희망하는 사람끼리 동호인 모임도 만들었다고 한다.
일가족의 영생목이 한 군데 모이면 가족 정원이 꾸며질 것이다.
▶독일의 헤센주(州) 호프가이스마(Hofgeismar)라는 작은 도시에는 수목장림까지 조성돼 있다.
40만평 가까운 참나무숲에서 자라는 수령(樹齡) 100년 이상의 참나무들이 영생목으로 팔린다.
그루당 가격은 3500 ~4000유로(490만~560만원).
나무 옆에 30㎝ 깊이로 화장처리한 골분을 묻게 된다.
골분은 땅속에서 쉽게 분해되는 나무상자나 종이 보자기에 담아야 한다.
묘석 등 인공물은 일절 설치하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자연친화적 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묘지의 넓이는 평균 19평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거면적은 4.3평이라니 죽어서 차지하는 면적이 살아 있을 적의 4배를 넘는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
설문조사에선 화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된다. 좁은 땅에 살다 간 흔적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오래 기억되는 게 아니다. 후손에게 짐만 될 뿐이다.
영생목에서 돋아나고 뻗어나는 잎새와 가지 하나하나에 죽은 이의 영혼을 의탁한다면
그게 곧 영생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만물상] 한삼희 논설위원 shhan@chosun.com
'●불교&자료&관심사● > 멋진 삶을 위한 웰다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티베트-천장(天葬) (0) | 2016.11.03 |
|---|---|
| 하늘장례/최명길 (0) | 2016.11.03 |
| 소멸의 아름다움/필립 시먼스 (0) | 2016.11.03 |
| 문인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남긴 유언 (0) | 2016.11.03 |
| 날 기억 하고자 한다면... (0) | 2016.11.03 |